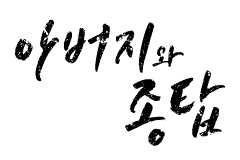예전부터 매미우는 소리는 그다지 즐겁지 않았다. 저도 슬퍼서 우는 것이라 생각하니 연민마저 일었는데, 알고 보니 구애의 방편이라 한다. 싫은 표현을 대놓고 할 걸 그랬다. 사랑을 구하는 노래라는 것이 땡볕에 물을 들어붓는다. 사우나독 안에서 바짝 달궈진 돌에 종지 물 떠 붓는 것과 흡사하다. 옥수수 밭이 주는 답답함을 모르면서 시골의 여름을 논하기는 어렵다. 조밀함에 습기가 더해지면 숨막히는 화생방훈련의 '가상현실체험'이 된다. 감자 밭 고랑에 뒹구는 돌멩이가 태양의 열기를 잔뜩 머금고 있다. 자칫 터질 것 같아 옆에 가기가 겁난다. 자갈투성이의 좁은 신작로는 하루 한 번 지나가는 달구지 같은 버스에게 깡마른 몸을 억지로 내준다. 염치없는 막걸리 차가 불쌍한 이놈의 등때기를 하루에도 몇 번씩 밟아 재낀다..